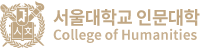[인터뷰] [연구동정] 현송학술기금 인문학 펠로우 배윤정

현송학술기금 인문학 펠로우 배윤정
말소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
저는 국어학 안에서 말소리를 다루는 음운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음운론의 연구 대상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음성 자료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흥미롭게 하고 있습니다. 음성 자료를 분석해 내면 말소리가 어떤 특징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어야 저 음운이 아닌 이 음운으로 인식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이 음운과 저 음운을 가르는 경계 지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박사학위논문은 “부산 지역어 성조의 음향음성학적 연구”였습니다.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로 말의 의미를 구별하는 체계인데, 현대 한국어의 경우 부산을 포함한 경상도, 그리고 강원도 일부 동쪽 지역에 성조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와 같이 성조가 없는 지역의 사람에게 부산 사람이 ‘나무’와 ‘토끼’를 발음해 들려준다면 어떨까요. ‘나무’는 LH 성조를 지니며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토끼’는 HH 성조를 지니며 처음부터 높게 시작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후 ‘사진’을 발음해 들려주고 ‘사진’이라는 소리는 ‘나무’와 ‘토끼’ 중 어떤 것과 같은 부류로 묶이는지를 물어봅니다. 경기 방언 화자라면 ‘토끼’라고 답하는 사람의 수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토끼’와 ‘사진’ 모두 음성적으로 높은 소리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산 사람들은 ‘나무’와 ‘사진’을 같은 LH 부류로 묶고 있습니다.
같은 소리를 듣고도 경기 방언 화자와 경상 방언 화자가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성조의 음높이가 언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이므로 해당 언어 사용자가 아니면 그 약속이 무엇인지조차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박사학위논문에서는 부산 지역어 화자들의 음성을 분석하여 부산의 ‘사진’과 ‘나무’를 묶어주는 음성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사진’과 ‘토끼’가 구별되는 정확한 지점을 수치로 정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부산 사람들은 소리가 얼마나 높고 낮은지 하는 것보다는 낮았던 소리가 언제 높아지는지, 높았던 소리가 언제 낮아지는지와 관련하여 그들만의 약속이 있고,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성조를 변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것은 비음의 길이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방언 자료를 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남매’를 ‘나매’라고 한다든지 ‘저녁’을 ‘전녁’이라고 말합니다. ‘ㅁ’의 개수에서 차이를 보이는 ‘남매’와 ‘나매’는 음성적으로는 ‘ㅁ’의 길이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ㅁ’을 짧게 발음하면 ‘나매’, 길게 발음하면 ‘남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조사되어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 본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경상도 지역에서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박사과정 첫 학기에 지도 선생님과 함께 중부 방언 화자들을 대상으로 비음의 길이에 대한 실험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나’에서의 ‘ㄴ’의 상대적 길이를 늘이고 줄여 만든 실험 재료들을 들려주고, 그것이 ‘다나’인지 ‘단나’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지각 실험이었습니다. 이번 추석에 경상 방언 화자인 친척들을 대상으로 이와 비슷한 지각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흥미롭게도 80대와 5-60대의 응답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소리를 듣고도 80대는 비음이 두 개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5-60대는 비음이 하나라고 응답하였습니다. 80대와 5-60대의 비음의 길이에 대한 약속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로써 경상도 지역의 경우 비음 길이의 인식에 세대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소리를 듣고 80대는 ‘남매’, 5-60대는 ‘나매’라고 인식한다면, 80대가 발음한 ‘남매’를 5-60대는 ‘나매’라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방언 자료들과 이 실험 결과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매’를 ‘나매’라고 하는 것과 ‘저녁’을 ‘전녁’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현상으로 봐도 좋은 것인지, ‘전녁’과 같은 자료들이 경상도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의 여러 의문에 대하여도 저 나름의 답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